바리데기(바리공주) – 버려진 아이, 저승길의 안내자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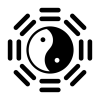
본문

바리데기(바리공주) – 버려진 아이, 저승길의 안내자가 되다
1) 개요·유례 — 한국만의 샤머니즘인가, 불교·도교의 영향인가
바리데기는 한반도 전역(제주 제외)에 널리 전승된 무속 신화의 핵심 서사입니다.
대체로 굿(특히 상여·천도 관련)에서 불리는 서사무가로 기능하며,
‘버려진 일곱째 공주가 저승을 건너 생명수/환생꽃을 구해 부모를 살리고, 그 공덕으로 무조신(무당의 시조)이 되었다’는 골자를 공유합니다.
[독자성(전통 기반)]
한국 무속에서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의례(오구굿·진오기굿)" 의 본말(本末)로 자리하며, 실제 굿판에서 구연되는 ‘본풀이’ 전통을 가집니다.
[혼합성(전통+수용)]
바리 서사의 저승 묘사에는 불교의 시왕·지옥관과 도교적 장생·영약(약수) 모티프가 함께 스며 있습니다.
학계 자료에서도 바리 본풀이의 저승관을 불교·도교 요소가 복합된 결과로 분석합니다.
정리: 서사는 한국 무속의 뿌리이되, 저승·영약·시왕 같은 구체 장면에는 불교·도교 영향이 겹쳐 보입니다.
2) 무속적 의미 — 무조신(巫祖神)·천도의 여신
바리데기는 지역마다 역할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망자를 건네는 신(심부름꾼이 아닌 안내자)"이자 무당의 원형으로 숭상됩니다.
실제 전승에서 바리는 상여 굿의 노래로 불리며, 죽은 이를 위로·천도하는 서사의 정당성을 마련합니다.
제주를 뺀 전국적 분포, 상여·천도 의례와의 결합, ‘무조신’ 인식은 여러 문헌·정리 자료에 반복 확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계 횡단: 생사 경계를 돌파해 약수를 구해 오는 저승행/귀환의 모티프
- 관계 회복: 버림받은 아이가 오히려 부모·혈연·공동체의 결을 복원
- 의례 정당화: 저승길 인도·천도 굿의 상징 논리를 제공
3) 오늘날의 바리데기 — 무속·학술·콘텐츠에서의 확장
바리데기는 지금도 망자 천도 의례에서 실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진오기굿(=서울새남굿),
동해안의 오구굿,
남도의 씻김굿에서 바리 서사가 ‘말미거리·발원굿·오구풀이/바리데기풀이’ 같은 거리로 구연됩니다.
[전승·공연·실연]
서울새남굿(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은 상황에 따라 ‘진진오기·마른진오기’ 등으로 지금도 의례가 진행되며,
전승공연과 사설교육도 병행됩니다.
[지역 무형유산]
인천(강화 교동) 등 지자체 단위로 진오기굿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전승을 이어갑니다.
[일상 의례 맥락]
가정 단위의제사(祖上祭)는 형식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행해지고,
‘죽은 이를 잘 떠나보낸다’는 목적의 기도·제(祭)·굿은 지역·가정 사정에 맞춰 유지·변형되어 왔습니다
덧붙여, 대중문화에서도 바리는 생생합니다.
예컨대 황석영의 소설 『바리데기』는 전통 서사를 난민·디아스포라 이야기로 현대화했고,
2025년엔 게임 SMITE 2가 한국 신격으로 Princess Bari를 추가해 ‘장례·보호 의식’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카카오 플랫폼의 웹툰 ‘바리공주’처럼 대중 매체에서도 등장합니다.
4) 바리데기 재해석
전승 핵심 문장을 한 겹 더 풀어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버려진 일곱째 공주가 저승을 건너 생명수/환생꽃을 구해 부모를 살리고, 그 공덕으로 무조신(무당의 시조)이 되었다.”
🔹버려짐 → 경계 횡단 → 살림 → 신격화
‘버려짐(타자화)’을 경험한 존재가 저승–이승의 경계를 스스로 건너 살림(생명 회복)을 수행하고, 그 공덕(功德)으로 신격화에 이른다는 구조입니다.
실제 바리 본풀이는 이 여정을 통해 망자 인도와 천도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유교 이전의 ‘효’ 정서와 연결
‘효(孝)’라는 용어의 체계화는 조선 유교에서 완성되었지만, 부모·조상에 대한 제의와 공경은 선유교적(고대) 조상숭배 속에 이미 자리했습니다.
즉, ‘부모를 살리려는 아이’라는 바리의 동기는 한국적 조상신앙·사후관(계세사상)의 토대 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덕을 쌓으면 신이 된다” – 한국 샤머니즘의 인본문화
한국 무속에는 인간이 공덕·사연·업적을 통해 신격이 되기도 하는 계통이 분명합니다.
이를 무당 세계에선 무조신(巫祖神) 계열로 설명하는데, 바리공주 역시 그러한 ‘사람에서 신으로’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됩니다(처용·법우화상 등과 함께).
신은 멀리 있는 절대적 타자라기보다, 인간의 행위와 기억이 빚어 올린 존재라는 점에서 바리는 인본주의적 샤머니즘의 상징입니다.
🔹의례적 윤리로서의 ‘케어(돌봄)의 영웅’
바리는 폭력이나 정복이 아닌 돌봄·인도·애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굿판에서 바리의 노래가 반드시*‘저승길 안내’에 붙는 이유이자, 오늘 우리가 이 서사를 애도의 윤리·케어의 정치로 읽는 이유입니다.
🔹 비폭력의 구원 서사 – 서구 영웅담과의 대비
많은 서구권 설화가 전투·탈환의 모티프(저승의 문지기와 대치하거나 죽음과 힘겨루기)로 구원을 그리는 것과 달리,
바리는 협상·인내·봉헌을 통해 길을 엽니다.
저승의 신을 ‘물리치기’보다, 규범을 존중하며 통과의례를 완수해 돌아오는 구조죠.
이 비폭력적 해결 방식은 우리 민속 정서—관계의 회복, 질서의 인정, 살림의 기술—가 반영된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5) 마무리
바리는 “경계를 건너 남을 건너게 하는 존재”입니다.
바리는 “경계를 건너 남을 건너게 하는 존재”입니다.
선유교적 조상숭배의 감정선과, 공덕을 기억해 사람을 신으로 올리는 한국 무속의 인본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바리는 지금도 기도·제·굿의 언어로 살아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