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의 본질 – 옛사람들은 왜 획수를 따지지 않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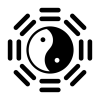
본문

📛 이름의 본질 – 옛사람들은 왜 획수를 따지지 않았나?
오늘날 이름을 지을 때는
획수, 자원오행, 사주팔자까지 복잡하게 따집니다.
마치 방정식처럼 이름의 의미를 수치로 조합하려는 시도지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 옛 이름 짓기의 중심은 ‘의미’였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름은 ‘가문의 정신’, ‘부모의 바람’, ‘삶의 지표’를 담는 철학적 문장이었습니다.
- 정약용(丁若鏞)은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라는 뜻이고,
- 퇴계 이황(李滉)은 물결처럼 깊고 넓은 학문의 뜻을 담았으며,
- 성삼문(成三問)은 세 가지 질문을 끌어안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기호가 아니라
정신의 응축이자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 수리성명학은 근대 이후 생겨난 이론이다
오늘날 유행하는
획수 중심 성명학, 자원오행, 삼재회피 등은 대부분
일본 메이지 시대 이후 만들어진 이름 이론입니다.
‘이름을 분석하고, 길흉을 따지고, 상업적으로 작명해주는 일’은
근대 이후 성행한 상업 작명소 문화에서 퍼졌습니다.
즉,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획수 분석’은
전통이 아니라 후대의 산물입니다.
🌿 그렇다면 오늘날엔 의미만 보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 오행, 음양, 자원 등도 하나의 조율 방식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름이 수치화되고, ‘흉수’나 ‘기운’으로만 평가되는 태도에 있습니다.
전통은 ‘기운을 보되 뜻을 잊지 않았고’,
현대는 ‘뜻을 무시한 채 기운만 따진다’는 점에서,
‘의미 중심’으로 이름을 다시 바라봅니다.
🪷 질문 -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수치인가요? 아니면 뜻인가요?
좋은 이름이란
길한 숫자를 맞춘 조합일까요,
아니면 누가 불러도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의미일까요?
전통은 수치가 아닌,
이름의 존재 이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