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학에서 본 흉수·길수의 탄생과 그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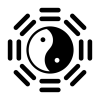
본문
🌿 성명학에서 본 흉수·길수의 탄생과 그 한계
1. 흉수·길수라는 잣대의 등장
성명학을 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몇 획은 길하다, 몇 획은 흉하다”라는 구분입니다.
마치 절대적인 법칙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고전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주역』이나 『천부경』 등 전통 경전 어디에도 획수에 길흉을 직접 규정한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후대 작명가들이 만든 편의적 체계였습니다. 이름을 설명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2. 중국 수리관념의 영향
숫자에 길흉을 붙이는 전통은 원래 중국 수리학(數理學)에서 출발했습니다.
홀수는 양(陽)이라 길하고, 짝수는 음(陰)이라 흉하다는 단순한 관념이 뿌리였습니다.
이 사고가 성명학으로 넘어오면서, 획수에도 같은 논리가 억지로 대입되었습니다.
예컨대,
2획 → 짝수라 음이 강해 흉하다
3획 → 홀수라 양이 발하고 길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3. 왜 이런 구분이 필요했을까?
실제로 이름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오행 배속이나 음양 조화를 설명하면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반면 “2획은 흉, 3획은 길” 같은 단순한 길흉표는 누구라도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적·실용적 접근을 위해 탄생한 일종의 ‘간편 해석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학파마다 다른 기준
더욱이 획수 길흉표는 학파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23획을 최고의 길수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21획을 으뜸이라 칩니다.
이는 검증된 원리가 아니라, 후대의 경험적 추정과 전승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5. 마무리 –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 길수·흉수는 본래의 성명학적 뿌리라기보다는 후대의 단순화 결과입니다.
이름의 본질을 보려면 획수에 담긴 "수리오행(五行의 배속)" 과 음양의 균형을 살펴야 합니다.
길수라 하더라도 오행이 사주와 충돌하면 흉으로 작용하고,
흉수라 하더라도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면 오히려 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학의 진정한 관점은 숫자의 길흉 여부가 아니라,
오행과 음양의 흐름을 얼마나 조화롭게 담아내는가에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