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장 – 죽음을 보내는 세 날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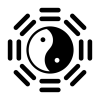
본문
⚰️ 3일장 – 죽음을 보내는 세 날의 의미
1. 3일장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한국 장례는 3일장이 기본이었습니다.
첫날은 영혼을 맞이하는 날,
둘째 날은 곡을 이어가며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날,
셋째 날은 발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 “사흘”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영혼이 몸을 떠나 조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중간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2. 무속적 배경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魂)과 백(魄)이 갈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날: 혼이 아직 집 안을 서성이며 산 자와 작별하지 못한 상태.
이때는 영혼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하여, 절을 할 때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둘째 날: 곡과 의례를 통해 망자의 넋을 달래고 떠날 길을 안내하는 날.
친척과 이웃이 모여 슬픔을 함께 나누고, 상여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날: 드디어 발인을 하여 망자가 조상신에게 합류하거나 저승사자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다고 여겼습니다.
이때부터 절은 두 번이 원칙이 됩니다.
따라서 사흘은 영혼이 머무는 유예 기간이자, 굿과 의례로 혼을 달래는 중요한 시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 불교와 3일장의 연관성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신(中陰身)으로 머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7일마다 재를 지내고, 마지막 49재에서 저승으로 향한다고 여겼지요.
이 사상은 무속적 3일장과 이어져,
사흘은 영혼이 집을 맴도는 초기 관문
그 뒤 49일은 저승으로 들어가는 긴 여정
이라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3일장은 무속적 의례로 지내고,
이후 불교의 7재·49재가 이어지며 망자를 천도하는 복합 장례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4. 왜 3일인가?
[ 자연의 순환 ]
해와 달이 사흘을 지나면 기운이 바뀐다고 여겼습니다.
[ 유교적 제도화 ]
조선시대에 들어와 장례를 단정히 치르도록 3일장을 권장했습니다.
[ 실질적 필요 ]
친척들이 모일 최소한의 시간, 시신을 오래 둘 수 없는 환경적 조건도 맞아떨어졌습니다.
🌌 맺음말
3일장은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망자의 영혼이 떠나는 길을 지켜보는 세 날이었습니다.
첫날은 아직 혼이 머물러 절도 한 번만 올렸고, 둘째 날은 곡으로 길을 닦으며, 셋째 날 발인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불교의 49재가 이어지면서, 무속과 불교가 함께 망자의 길을 안내해온 것입니다.
오늘날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어지는 3일장 역시, 슬픔을 추스르고 영혼의 길을 열어주려는 옛 지혜의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